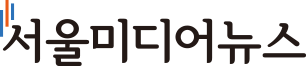[서울미디어뉴스] 김상진 기자 =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서평 talk]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는 분단과 독재, 허위의 시대를 향한 강렬한 저항의 노래이자, 진정한 인간성과 통일의 염원을 담은 상징시다. “껍데기는 가라”라는 반복적 외침은 단순한 배제의 구호가 아니라, 위선과 가식, 억압의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만 남으라는 시대적 선언이다.
시 속의 “동학년 곰나루의 아우성”은 민중의 혁명적 함성을, “아사달 아사녀”는 민족의 화해와 재탄생을 상징한다.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이라는 표현은 육체와 영혼을 다해 진실로 맞서는 인간의 순결한 사랑, 나아가 민족적 결합의 은유로 읽힌다.
마지막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는 남북의 이념과 폭력, 전쟁의 잔재를 걷어내고 오직 생명과 평화의 대지로 돌아가길 바라는 시인의 염원이다.
이 시는 시대의 거짓을 향한 예언자적 언어이자,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외침이다. 껍데기를 벗고 진실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영혼—그것이 신동엽이 남긴 ‘시의 혁명’이다.
SNS 기사보내기
서울미디어뉴스는 권력과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겠습니다
후원하기
김상진 기자
ksj69031@naver.com